|
|
박승민의 첫 시집 <지붕의 등뼈>(푸른사상, 2011)는 연로한 부모를 안타까워하고 어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삶의 외진 자리나 막다른 곳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듬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무릉(武陵)에서 길을 잃다’·‘면경(面鏡)의 얼굴’·‘지붕의 등뼈’가 전자라면 ‘명자 씨’·‘목련 사내’·‘단풍’은 후자다. 후자를 대표하는 ‘미선이’ 전문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화단에서 / 미선이가 하얗게 웃고 있다 / 6학년 때 짝이던 미선이 / 철탄산 밑 수용소에서 / 상이군인 아버지와 살던 애 / 폭폭한 아버지의 울분이 / 갈고리 팔로 문살을 내리칠 때 / 소주됫병이 방고래에 부서질 때 / 똥깐으로 도망가서 / 똥탑이 얼도록 나오지 못하던 애 / 아침에 문구멍으로 보면 / 물밥에 간장을 후르륵하던 애 / 점심시간이면 뒷산으로 / 유령처럼 사라지던 미선이 / 가끔씩 여름 조회 때면 / 운동장에 하얗게 쓰러지던 애 / 친구들이 비석치기 공기놀이로 / 골목길을 달릴 때 / 공동우물가에서 어른들 틈에 끼여 / 도라지 까기로 소주값을 벌던 애 / 졸업 앨범에서도 영영 사라진 그 애 / 오늘, 바랜 분홍치마로 / 나뭇가지에 매달려 흔들리는 / 35년 전의 그 명찰”
‘미선이’는 순수시의 원조였던 김춘수의 ‘꽃’과 같은 원리로 쓰여졌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에는 이미 온갖 고평이 나와 있다. 첫 두 연에서 보았듯이 존재는 부름과 응답으로 현현한다는 해석, 이름부르기가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하기(“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또는 시의 마지막 연을 가져와 존재는 폐쇄적이지 않고 무한히 개방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나 ‘꽃’이 속해 있는 서정시의 원리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부름과 응답이나 쌍방향 소통을 배려하지 않는다. 서정시는 화자가 세계 또는 대상을 포획하는 형식이다. 서정시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배려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격된다. 서정 시인은 자신의 언어와 정념으로 대상을 체포한다. 시인이 “너 뭐뭐한 꽃!”하면, 그 시인이 던진 말의 수갑에 채워진 꽃은 불시에 “뭐뭐한 꽃”이 되고 만다. 자연에는 입이 없고, 명명의 권한은 시인에게만 있다.
1980년대의 민중시 가운데는 타인의 자서전을 대필한 시가 많아서, 그것 자체로 하나의 장르일 정도였다. 당시의 민중시인들이 자서전을 대필해주었던 농부, 노동자, 버스안내양, 창녀, 야학생, 구두딱이 등의 무수한 민중은 시인들의 정념과 목적에 의해 재단되었다. 김춘수의 ‘꽃’에 꽃의 자리가 없고, 박승민의 ‘미선이’에 미선이의 주장이 없는 형국이다. 전문 시인이 민중의 자서전을 대필했던 이런 상황은 박노해, 백무산 등등, 그 동안 입이 없었던 민중이 직접 입을 열게 됨으로써 진정성을 잃는 것과 함께 대필의 윤리적 타당성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예전의 민중시인들이 타자를 나에게 동화시키는 자기동일성의 시학(전통 서정시의 시학)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다.
실상 <지붕의 등뼈>에 노골적으로 타인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시는 두어 편 남짓하다. 그렇다고해서 이 시집이 나를 타자에 동화시키는 역동일시의 방법(타자의 시학)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집은 시인에게 닥친 파국(破局)과 애도를 담았다. “가장 먼 순례는 / 자기의 내륙을 황단하는 길”(‘화기–능소화’)은 파국 이후의 심정을 보여주는데, 그 원점에 참척(慘慽)의 아픔이 있다. 유부남이 대놓고 “애인”(‘가흥동 마애불’·‘피의 온도’)을 부르고, 보란 듯이 ‘불륜’이라는 제목의 시를 쓴 까닭을 ‘연리목(蓮理木)’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애인도 불륜도 모두 시인이 이 시집을 바친 어린 아들 그레고리오를 애도하며 그리워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런 통점(痛點)을 모르는 독자에게는 ‘가족 사진’도 일상의 풍경일 것이다.
장정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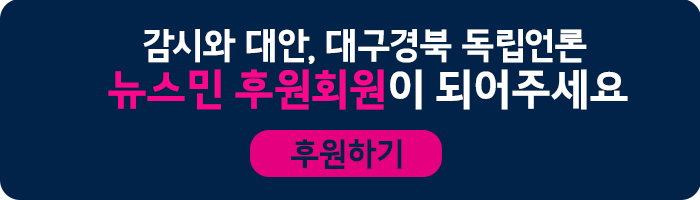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무비053] 지방 청년세대의 꿈과 도전이 희미해지는 풍경](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still1_Just-Films-218x150.jpg?v=1747580447)
![[장정일의 플라톤 추방] 파국과 애도의 시집](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10/jji-218x150.jpg)
![[#053/054] 빛의 혁명과 홍준표 국무총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ljmmm-218x150.jpg?v=1747550159)
![[#053/054] 윤석열이 남긴 교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kj-218x150.jpg?v=1747028222)
![[뉴민스를 만나다] “세상을 보는 깨끗한 창, 잘 버텨서 이어가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asghha-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족집게 기후학자 뉴민스의 바람](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khdinf-218x150.jpg?v=1747029964)
![[뉴민스를 만나다] 밭의 일상, 농부의 삶도 들여봐 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HSH-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뉴민스,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 더 나왔으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8/IMG_20220804_112409_507-218x150.jpg?v=1660181038)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