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90년 12월 말 도목정사(인사 관련 회의)를 통해 당상관인 오위장에 오른 노상추는 불과 6개월만에 그 자리를 잃었다. 1791년 음력 6월의 일로, 결과 만큼이나 이유도 황당했다. 정3품의 문무관료에게 주어지는 당상관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거기에 오르는 게 별따기만큼 어렵지만, 그처럼 어렵게 따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너무 쉽게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왔다.
이 일은 뒤주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묘인 현륭원을 화성에 조성하는 공사 때문에 일어났다. 현륭원 조성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요즘도 공원이나 공공기관 건축에서 조경이 중요한 것처럼, 조선시대 역시 왕릉이나 그에 준하는 묘를 만들 때 소나무를 식재하는 조경이 중요했다. 지금과 달리 토목 및 건축 자재나 난방 용도로 나무 사용이 많다 보니, 나무를 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현륭원 조성을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나무 자체가 귀한 현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왕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나무를 사들여 이를 조성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왕실의 역사役事이다보니, 왕에게 잘 보여 공을 세울 목적으로 나무를 바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당연히 구하기 어려운 나무를 구할 수 있었으니, 왕실 역시 나무를 바친 사람들을 꼼꼼히 살폈고, 심어 놓은 나무 상태에 따라 그 공을 치하하고 상을 내리기도 했다. 심지어 나무를 바치지 않은 채 나무를 심는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이라도, 그 공을 인정받을 정도였다. 현륭원 나무 식재에 정조는 그만큼 진심이었다.
서울 출신 군관 이경대李敬大는 현륭원 소나무 식재에 공을 세운 인물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었다. 그가 나무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소나무를 무려 7만 그루나 구해서 심었다. 이 가운데 뿌리를 내린 게 3,000그루 밖에 되지 않아 식재 성공률은 아쉽기 그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경대 다음으로 많이 낸 사람의 수치를 몇 배 상회할 정도였다. 정조 역시 뿌리 내린 나무가 적은 것을 아쉬워 하면서도 이경대의 수고는 인정할 정도였다. 정조는 이경대 등에게 나무 심은 값을 넉넉하게 치러주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이경대는 자기 충심을 강조하기 위해 나무 심은 값을 받지 않겠다면서 돈으로 돌려 받는 것을 거부했다. 7만 그루 전체에 대한 나무 값과 이를 심은 부역까지 하면, 당시 상황에서도 만만치 않은 돈이었을 터였다. 그러나 이를 왕에 대한 충심을 이유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정조로서도 미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제는 나무 값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드러난 그의 충성심에 답해야 할 때였다. 결국 정조는 군관이었던 이경대의 신분을 고려하여 왕을 호위하던 두 군영 가운데 한 군데 당상관직을 내리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 노상추의 오위장 자리였다.
몇 안되는 당상관 자리로 때문에, 노상추의 오위장 자리를 소나무 7만 그루에 빼앗겼다. 이경대는 위풍당당하게 궐에 들어와 노상추가 가진 위자패를 받아 입직을 시작했고, 노상추는 졸지에 임기를 다한 전임 오위장 신세가 되었다. 6월 말에 있을 첫 인사평가도 받지 않은 채 쫒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노상추로서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떻게든 관직을 받지 않으면 녹봉을 받지 못할 처지이다 보니,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살림을 생각하면 이경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무과에 합격한 이후, 임기가 끝날 때면 늘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노상추였으므로, 어쩌면 이러한 일에는 익숙하기까지 했다.
우선은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찾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본인 잘못도 아닌 일로 자리를 잃었으니, 일말의 동정심은 기대할 수 있을 듯했다. 그는 우선 새롭게 이조판서에 임명된 정창순을 찾아, 문후를 여쭙고 자신의 사정을 토로했다. 비록 6개월이지만 포폄(인사평가)도 잘 받아야 도목정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병마절도사 조규진을 찾아 부탁을 했다. 마지막으로 병조판서를 찾아 관직을 부탁한 후, 며칠 뒤 있을 도목정사의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노상추의 것이 아니었다. 6개월만에 자리를 잃은 억울함이 노상추만의 일도 아니었던 듯했다. 장용영 군제 변화로 인해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고, 병조 입장에서는 노상추를 비롯한 모든 이들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녹봉없이 다음 도목정사까지 서울에 머물 수도 없는 시골 출신의 무관 입장에서는 다음 도목정사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소나무 7만 그루 때문에 튄 파편으로 노상추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다.
모든 직장에서 고위직 인사는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있어도, 희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소나무 7만 그루로 인해 당상관이 교체되고, 왕의 시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는 승진과 탈락에 따른 단순 희비의 문제와는 결을 달리하게 된다. 노상추의 억울함은 인사 탈락에 따른 슬픔을 넘어, 능력보다 인사권자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능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의 코드에 맞추고 인사권자가 좋아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이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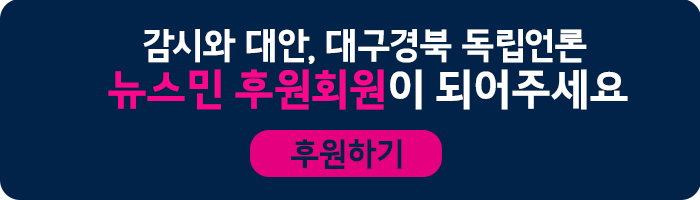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준표청산] “시민엔 가혹, 측근엔 관대”···대구경실련, 홍준표 측근 ‘관사 특혜’ 비판](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7/HONGJUNGLEE-218x150.jpg?v=1751524439)
![[다른 듯 같은 역사] 소나무 7만 그루와 바꾼 오위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작가의 첫 도전으로 기억될 영화](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movie_494-218x150.png)
![[#053/054] ‘음주운전 바꿔치기’ 논란 구의원과 함께하는 청렴결백 캠페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n-218x150.jpg)
![[#053/054] 경북을 향한 뉴스민의 약속](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bag-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평범한 사람들을 기록해 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1-6-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작된 인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ahgb-218x150.jpg)
![[광장 : TK리부트] ⑧-9. 정한숙, “깨어있는 시민들이 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jung-218x150.jpg?v=1748408572)
![[광장 : TK리부트] ⑧-8. 박다연,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parkdy-218x150.jpg?v=1749527430)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다른 듯 같은 역사] 나이가 벼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100x70.jpg)
![[다른 듯 같은 역사] 1787년 이윤빈 무고 사건](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0/08/lsh-100x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