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영朴英(1471~1540)은 영남 사림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불사이군不事二君(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의 신념에 따라 조선 건국을 반대하면서 고향으로 낙향했던 길재와 스승 정붕의 학문을 이어, 낙동강 중류 선산을 중심으로 실천과 의리를 강조했던 초기 영남 사림의 탄생과 흥기에 기여했다. 금오서원 창건을 주도하고, 그 역시 금오서원에 배향되면서, 선산 지역 사림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지역에서는 그의 호를 딴 ‘송당 학파’가 만들어졌고, 그가 살았던 고을은 그의 호를 딴 ‘송당촌’으로 명명되었다. 당연히 그가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 태조산 곁에 그를 기리는 사당인 ‘송당’까지 건립되어 지역 유림들이 그를 기념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사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190년이 지난 1781년, 박영의 후손인 박씨 집안과 그의 제자들 세 집안, 그리고 박영의 스승 정붕의 후손인 정씨 집안이 힘을 합쳐 송당을 재건했다. 그리고 계를 만들어 박영의 학문을 잇기 위해 강학을 시작했는데, 이 계의 이름이 오가계五家稧, 즉 ‘다섯 문중의 계’였다. 박영이 사망한 지 240년이 지나도 그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흔들리는 데에는 몇십 년 걸리지 않았다. 1829년 음력 4월 17일, 노상추의 기록에 따르면 송당촌 중심으로 형성된 오가계의 우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송당의 운영을 두고 집안들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재물 문제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어느 집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집안이 그릇된 의리를 고집하면서 계의 재물을 독점하고 강회를 폐지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건한 지 50년도 되지 않은 송당도 낡았다면서 제멋대로 허물어 버려서, 당 앞에 있었던 신도비는 터만 남은 유허비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송당을 독점했던 이는 송당을 허물었을 때 나온 기와를 김필환이라는 사람과 거래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새집을 짓기 위해 기와를 찾고 있던 김필환은 45냥을 제안했고, 여기에 송당을 허문 사람들이 응했다. 그러나 송당에서 나온 기와를 파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자, 사는 이도 부담이 되었던 지 거래가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김필환은 다행히 성곡동이라는 고을에서 화재 때 쓰려고 사두었던 기와를 구입하면서 낭패는 면했지만, 송당의 기와까지 팔려고 했던 일은 지역에서 이리 저리 회자될 수밖에 없었다. 노상추를 비롯한 지역 유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풍을 새롭게 진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직을 역임했던 노상추가 지역 장로로서 이 일에 나서야 했다. 그는 오가계의 불의한 행동을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문중과 지역 유림들로 하여금 송당에 모일 것을 제안했다. 일단 다섯 문중이 모이면 지역의 장로들이 나서 이를 중재하고, 송당을 건립할 당시의 우의를 재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송당의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다. 송당이 가난해서 모임을 감당할 형펀도 안되거니와, 모임의 목적이 송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섯 집안의 각 댁에 대한 문제이므로 송당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다섯 집안 문제가 송당의 문제이지만, 송당의 관리자들은 이를 구분했다.
결국 노상추는 모임 장소를 문산서원으로 옮기고, 다섯 집안에 다시 통문을 냈다. 그러나 문산서원 모임은 썰렁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박영의 후손 한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 집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 문중 사람들 모두를 모아 놓고 지역 문풍을 진작시키려 했던 노상추를 비롯한 몇몇 장로들의 체면만 구겨졌다. 이미 다섯 문중은 지역 장로들의 중재로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재물과 송당을 독점한 문중은 문중대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 했고, 나머지 문중은 더 이상 이것이 논의와 우의를 다지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했다.
송당의 문제는 이때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한 세대 뒤인 1860년에서야 재건되었다. 당연히 다섯 문중을 중심으로 한 우의는 갈등으로 변모했고, 우의의 상징이었던 다섯 문중의 강학 전통도 끊어졌다. 가까워야 할 박영의 후손들과 그의 학문적 후예들은 송당을 재건하기 전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고, 이는 결국 지역 갈등의 축으로 떠올랐다. 물론 송당을 재건할 당시야 대의와 명분에 따라 움직였겠지만, 불과 한 세대만 지나도 그들을 움직이는 게 더 이상 대의와 명분이 아니었다. 재물은 바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오랜 그들의 우의마저 깨 버렸던 것이다.
송당을 재건하던 1781년의 상황인들, 모든 집안의 재정적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았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의를 바탕으로 누군가는 더 힘든 일을 자임했고, 누군가는 재물을 더 부담하는 데 흔쾌히 동의했을 것이다. 일이 될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송당에 대한 주도권을 특정 집안이 가지려 하고, 다섯 문중이 만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넘치면, 어렵게 만든 송당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관계는 차라리 송당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일이 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명분과 지향점이 중심이어야 할 모임이 세대를 넘기 힘든 이유이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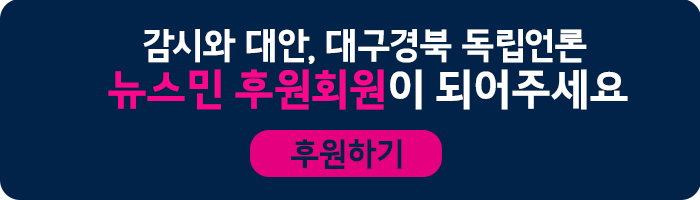


![[현장] 매진 행렬 삼성라이온즈, 홈 경기 현장표 빼놓은 까닭](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7/lo-218x150.jpg?v=1751623234)



![[다른 듯 같은 역사] 소나무 7만 그루와 바꾼 오위장](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무비053]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작가의 첫 도전으로 기억될 영화](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movie_494-218x150.png)
![[#053/054] ‘음주운전 바꿔치기’ 논란 구의원과 함께하는 청렴결백 캠페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n-218x150.jpg)
![[#053/054] 경북을 향한 뉴스민의 약속](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bag-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평범한 사람들을 기록해 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1-6-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작된 인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ahgb-218x150.jpg)
![[광장 : TK리부트] ⑧-9. 정한숙, “깨어있는 시민들이 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jung-218x150.jpg?v=1748408572)
![[광장 : TK리부트] ⑧-8. 박다연,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parkdy-218x150.jpg?v=1749527430)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