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지난해 6월 작고한 문인수 시인 고향 성주에서 시인과 그의 시적 성취를 기리는 문학세미나 ‘문인수를 그리다’가 성주문화도시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심산기념관 2층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성주문학회(회장 정동수 시인)와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문인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故 문인수 시인의 시 ‘밤길’을 판소리로 연주한 장성빈의 공연(반주:황산하)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김수상 시인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손진은 문학평론가 발제, 김선굉 시인(대구시인협회)과 노태맹 시인(성주문학회)의 토론으로 약 90분 동안 이어졌다.

지리산 앉고,
섬진강은 참 긴 소리다.저녁노을 시뻘건 것 물에 씻고 나서
저 달, 소리북 하나 또 중천 높이 걸린다.
산이 무겁게, 발원의 사내가 다시 어둑어둑
고쳐 눌러 앉는다.이 미친 향기의 북채는 어디 숨어 춤추나.
매화 폭발 자욱한 그 아래를 봐라.
뚝, 뚝, 뚝, 듣는 동백의 대가리들.
선혈의 천둥
난타가 지나간다.– ‘채와 북 사이, 동백 진다’ 전문, <동강의 높은 새> 가운데
손진은 평론가는 ‘문인수의 시와 성주, 그리고 너머’란 제목으로 성주의 ‘방올음산’과 ‘흰내’, ‘어머니’, ‘정선’, ‘인도’ 같은 문인수의 시어를 통해 드러난 시인의 서정을 해설했다. 손 평론가는 ‘채와 북 사이, 동백 진다’를 두고 “한의 정서를 절절히도 풀어낸다”고 평했다.
“지리산을 휘감고 흐르는 섬진강을 긴 (판)소리라 한다면, 그 유장한 소리를 열고 쉬고 닫게 하는 고수는 지리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천에 높이 걸린 달은 필시 북소리일 터. ‘저녁노을 시뻘건 것’ 물에 씻고 나서 저 달북, 하얗고 높은 득음에 이르렀다. 그 소리와 함께 고수, 지리산의 북채가 난타하니 붉은 매화도, 선혈의 동백 가리도 뚝, 뚝, 뚝 들으며 피울음으로 화답한다, 천지가 화합하여 어우러지면서 한의 정서를 절절히도 풀어낸다.” (손진은 평론가)
그는 “문인수의 시는, 진창에서, 가시밭길에서, 오욕에서, 수모에서, 죄 속에서 피워올리는, 이 세상 아닌 순간이었으면 싶을 때 피어나는 꽃”이라고 발제문을 맺었다.
이어진 김선굉 시인은 성주와 문인수의 시가 맺고 있는 관계성을 강조면서 ‘성주가 그를 낳았고, 그는 성주를 노래했다’는 제목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 시인은 “성주군 초전면 대장동 630번지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 문인수, 말하자면 성주가 그를 낳았고, 성주가 그를 길러서 세상에 내보냈으며, 그는 성주에 서정의 닻을 내리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열어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평했다.
노태맹 시인은 토론문 ‘‘문인수’라는 표식(標式)’ 서두에서 “문인수의 시는 어째서 혹은 왜 아름다운가? 왜 ‘문인수’라는 시인이고, 어떻게 문인수 ‘문학제’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과장 없이 그는 우리 당대의 최고의 시인 중의 한 명”이라고 자답했다.
노 시인은 문인수의 시 가운데 ‘중력’, ‘배꼽’, ‘거처’, ‘바람, 못 간다’, ‘채와 북 사이, 동백 진다’ 같은 시를 가져와 작품을 직접 읽어가며 시를 분석했다.
그는 ‘거처’, ‘바람, 못 간다’를 같이 분석하며 “바람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재의 찬사이지만 그 찬사는 너무나 미약하여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는 죽음, 그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부재에 대한 동경을 동시에 갖는다. 시인의 표현처럼 바람은 대나무 숲을 ‘시퍼렇게 쓸어 안으며 울부짖으며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절창으로 소개한 ‘채와 북 사이, 동백 진다’를 “시각, 청각, 후각이 공감각적으로 울리는 시”라고 평하고, 하이데거의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를 인용해 “문인수 시인은 신이 머물 몇 개의 체류지를 남기고 가셨다. 그가 남긴 체류지에 우리의 동시대인들을 위해 표식을 남겨둘 필요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람이 잔다. 아, 결국
기댈 데란 허공뿐이다.”
-‘거처’ 전문. “그립다는 말의 긴 팔” 가운데“제 몸 일으켜 떠나는 이별을 믿는지.
대숲에, 대숲에,
또 시퍼렇게 쓸어안으며 울부짖으며 무너지는 바람……나, 못 간다.
– ‘바람, 못 간다’ 전문, <그립다는 말의 긴 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박덕희 시인(성주문학회 부회장)은 “시인의 삶과 시를 기리고자 성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뜻을 모았다. 한국 서정시의 빼어난 미학을 구축한 문인수 시인은 고향 성주와 관련된 시편이 상당하다. 시인의 고향인 성주를 문학의 고장으로 발돋움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7일 작고한 문인수 시인은 194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과를 중퇴했다. 불혹에 심상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은 이듬해 첫 시집 <늪이 늪에 젖듯이>(1986, 심상시인선)를 출간하고, <세상 모든 길은 집으로 간다>(1990, 문학아카데미), <뿔>(1992, 민음사), <홰치는 산>(1999, 만인사), <동강의 높은 새>(2000, 세계사)’, <쉬!>(2006, 문학동네), <배꼽>(2009, 창비), <적막 소리>(2012, 창비), <달북>(2014, 시인동네) 등 서정 깊은 시집을 연이어 펴냈다. (관련기사=“가볍고 가벼워서 짐이 없는” 몸으로 돌아간 문인수(‘21.6.11))
시인은 영남일보에서 교열 기자(1992~1998)로 일하는 동안 받은 제14회 대구문학상(1996)을 시작으로 김달진문학상(2000), 노작문학상(2003), 미당문학상(2007), 목월문학상(2016)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용태 기자
joydrive@news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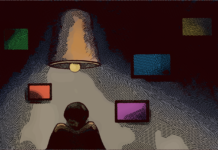

![[무비053]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작가의 첫 도전으로 기억될 영화](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movie_494-218x150.png)
![[#053/054] ‘음주운전 바꿔치기’ 논란 구의원과 함께하는 청렴결백 캠페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n-218x150.jpg)
![[#053/054] 경북을 향한 뉴스민의 약속](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bag-218x150.jpg)
![[다른 듯 같은 역사] 나이가 벼슬](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3/02/lsh-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평범한 사람들을 기록해 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1-6-218x150.jpg)
![[뉴민스를 만나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작된 인연](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ahgb-218x150.jpg)
![[광장 : TK리부트] ⑧-9. 정한숙, “깨어있는 시민들이 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5/jung-218x150.jpg?v=1748408572)
![[광장 : TK리부트] ⑧-8. 박다연,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5/06/parkdy-218x150.jpg?v=1749527430)


![[인포그래픽] 전국 시·군 응급환자 출동-병원 도착 소요시간](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2/04/sos1-218x150.png)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1/10/leejunghyun2-218x150.jpg?v=1633681291)
![[영상] 해고 9년 만에 복직,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22명의 출근길](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8/0801feat-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 정치과학#13] 임성근, 이화영, 헌법 제84조, 국민연금](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7/feat0701-218x150.jpg)
![[김수민의 뉴스밑장#특집] 516 아닌 대구경북 518](https://www.newsmin.co.kr/news/wp-content/uploads/2024/05/0518feat-218x150.jpg)








